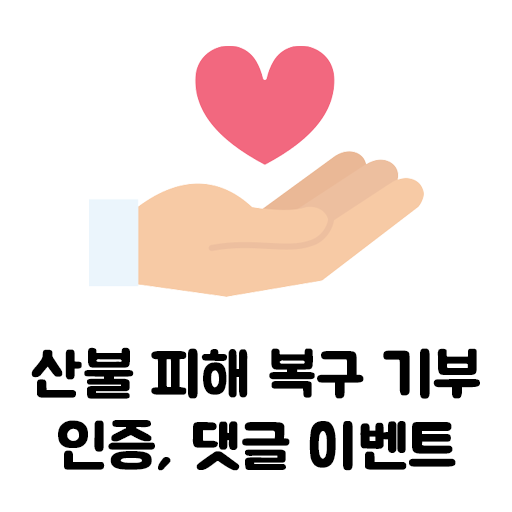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반도지만, 휴전선에 의해 가로막혀 현실적으로는 대륙과 차단된 섬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을 수백년간 섬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 외부인들, 서양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최초로 대륙이동설을 제안했으며, 네덜란드 지도학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16세기의 저명한 지도 제작자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는, 루이스 테세이라(Ludoico Teisera)의 서한(1592)에 담긴 당대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일본 지도를 그렸습니다. 테세이라의 묘사에 따른 동아시아의 지도들을 '테세이라 유형 지도'라고도 부릅니다.
1595년에 출판된 이 지도에서 우리 나라는 길고 뾰족한 섬(Corea Insula)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마도 '조선'으로 추정되는 타욱셈(Tauxem)이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에는 고려로 추정되는 코리(Corij)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들로 추정되는 한국섬 남부의 섬들에는 '약탈자들의 군도(Ilhas dos ladrones)'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마찬가지로 뾰족한 한국섬의 남쪽 부분은 '약탈자 곶(Punta dos ladrones)'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지도는 최소 향후 50여년 간 일본과 한국섬 지역의 한 전범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묘사한 린스호턴의 일년 뒤의 지도에서도 한국은 눈물 방울 모양의 섬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한국이 섬인지 반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인지, 한국과 중국 경계 부분에 불분명한 모래톱 표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을 거의 원형에 가까운 섬으로 묘사한 유일한 지도입니다. 동 시대의 다른 지도에서 한국은 주로 길고 뾰족한 섬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서쪽의 아시아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타타르와 중국의 만리장성을 묘사하고 있는 요도쿠스 혼디우스의 이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오른쪽 귀퉁이의 섬으로 묘사됩니다. 코레아 섬의 수도는 여전히 타욱셈(Tauxem)이라 쓰여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10년 뒤에 출판한 중국 지도에서도 여전히 한국은 반도에 가까운 섬인데, 세부 묘사가 추가돼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코라이(Corai)라고 불리는 카오리(Caoli)족은 코리아(Corea)에 사는데, 이곳이 섬인지 대륙의 일부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원주민들은 피부가 희고 체격이 크며 전장에서는 용맹하나 잔혹한 성정을 지닌 야만인들이다."
한국은 왜 섬으로 묘사됐을까?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동방의 어느 미지의 나라를 두고 솔랑가(Solanga), 또는 카울리(Kauli)라 언급한 이래, 수백년간 한국이라는 땅은 서구유럽인들에게 있어 베일에 싸인 곳이었습니다.
기록상 가장 먼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은 것은 포르투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남해안에 난파하여 표류한 뒤 중국으로 압송되기도 하였고,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고리스(Gores)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포르투갈어 필사본도 존재합니다.
혹자는 고리스(Gores) 사람들이 류큐에 체류하던 조선인들이라고도 하는데, 고리스 사람들이 정말로 조선인들이었는지 그 사실의 여부와는 별개로 포르투갈인들에게 있어서 극동의 정보는 국가적 기밀사항이었기에 당시의 대중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딩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몇몇의 왕실 역사가들 뿐이었기에, 이러한 언급은 다른 정보와 연결되지 못한 채 일회성의 막다른 길에서 그쳤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회 소속 수사들이었습니다.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예수회 수사들은 일본인들의 말을 통해 중국의 동쪽에 담비 가죽과 면직물을 교역하는 코레아(Corea)라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1550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일행이 직접 일본에 체류하던 조선인 사절단을 마주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기록상 최초의 조선인 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스파르 비렐라(Gaspar Vilela) 신부는 일본에서 배타고 사흘 거리에 코라이(Coray)라고 부르는 큰 왕국이 바로 예로부터 '타르타리아'로 부르던 그 땅이며, 산이 많고 산에는 각종 맹수들이 살고 있으며, 중국의 아래쪽으로 뻗어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피부가 희고 싸움을 잘하며 말을 잘 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조선으로 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예수회의 순찰사였던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신부는 자신의 요약보고서(Summario)에서 중국의 동쪽 지방에 중국과는 풍속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으며 유럽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어떤 측면에 있어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머물던 루이스 프로이스 신부는 조선이 일본과 바다로 분리되어있으며 이전에는 섬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중국과 연결된 반도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조선이 일본인을 제외한 그 어떤 외국인과도 무역을 하지 않으며 만일 외국의 범선이 그 땅에 난파한다면 곧장 선박을 이끌고 와 전투를 시도하며 내쫓아버린다며 그 호전성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한반도를 사실상(이전에 난파한 포르투갈 선원을 제외한다면) 최초로 방문한 유럽인은 1593년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신부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가톨릭 다이묘였던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에서 종군하여 조선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이 너무 춥다는 특이사항 이외에, 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대한 예수회의 이러한 최신 정보들은 점차 영국과 네덜란드 등 대항해시대의 후발주자들에게도 알려지게됩니다. 인도 고아에서 대주교의 비서를 역임했던 네덜란드의 얀 하위헌 판 린스호턴은 1598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 자료를 종합해 한국(Cooray)이 하나의 거대한 섬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으며, 영국의 저술가 리처드 해클리트 또한 프로이스와 세스페데스의 서한 등 예수회 출처의 최신 자료들을 정리하여 출판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대항해시대 초기 서양인들의 인식은 중국과 일본을 거쳐야만 했기에, 많은 부분에서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조공국으로서의 조선, 일본에게 침략당한 추운 땅으로서의 조선,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나운 이교도 야만인의 땅으로서의 조선,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미지는 이렇게 16세기 동안 형성되어 17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인들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 유튜브에 이미 업로드한 영상의 대본이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